
영화 전문가들은 왜 극장 문제에 대해선 침묵할까
[엔터미디어=듀나의 영화낙서판] 최근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기대반, 실망반이다. 일단 라이업은 상당히 좋다. 주관적인 개인 취향을 고려해도 그렇고 보편적인 영화광 취향을 고려해도 그렇다. 작품들을 보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보다 훨씬 당긴다.
하지만 영화제의 하드웨어를 이루는 조건들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일단 전주국제영화제는 기존 영화의 거리 상영관을 대부분 포기하고 전주 효자 CGV 전 7관을 메인 상영관으로 잡았다. 지난 영화제 동안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던 축제의 공간 자체를 파괴한 것이다. 효자 CGV는 영화의 거리와도 멀고 개회식과 시상식과 야외 상영이 열릴 전주 종합 경기장과도 멀다. 다른 도시에서 영화제를 찾을 관객에 대한 배려 자체가 없다.
효자 CGV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아, 뭔말을 하려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독자들도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짐작이 맞다. 주최 측에서는 "새로 지어 시설이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고 싶은 모양인데, 새로 지은 CGV 상영관이란 건 그 극장이 처음부터 불구로 지어졌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마스킹 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와이드스크린 영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을 게 분명하다.
필자는 피터 스트릭랜드의 <듀크 오브 버건디>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컴컴한 음란함이 마스킹 안 된 붕 뜬 화면으로 망가질 걸 생각하니 효자 CGV에서만 한다면 처음부터 안 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한 영화에 대한 최초의 기억이 평생 그 영화의 인상을 지배한다"라는 정성일 평론가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좋은 영화는 그 수준에 맞는 좋은 상영조건을 요구한다. 물론 CGV의 높은 양반들은 화면이 밝은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청맹과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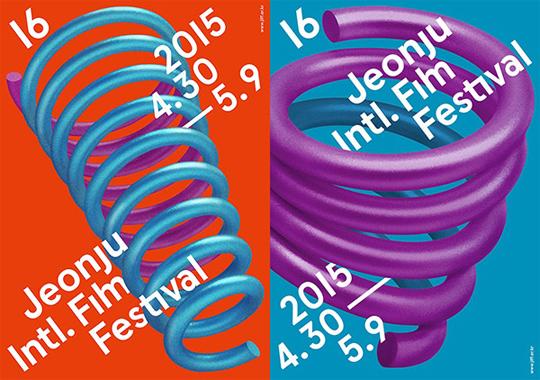
제한된 해결책은 있다. 와이드스크린 영화는 될 수 있는 한 와이드스크린 상영관이나 와이드스크린 상영이 가능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주 시네마타운에는 오로지 와이드스크린 영화만 몰아주라고 제안하는 바다. 작년에 그 상영관에서 양옆이 훤하게 뚫린 <언더 더 스킨>을 보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른다. 그럴 줄 알았다면 그냥 기다렸다가 극장 개봉할 때 봤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신촌 메가박스에서 다시 본 <언더 더 스킨>은 전주에서 본 같은 영화보다 최소한 20퍼센트는 더 좋았다.
물론 영화제 사람들은 지금 일도 바쁜데 그런 일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상영조건에 대한 고려를 포기하는 것은 길거리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양보가 습관화되면 깨진 유리창은 하나씩 늘어나고 곧 거리 전체가 슬럼화된다. CGV가 기초 마스킹을 포기하고 그 빈자리를 스크린 엑스 광고로 채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번지르르한 슬럼화는 시작되었다. 이런 슬럼화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한국영화 위기론을 들고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비웃고 싶을뿐이다.
대한민국 멀티플렉스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조금만 검색하면 비슷한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164619)

이 기사를 고른 건 내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 자체뿐만 아니라 상영관에 대한 관객들의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물론 더 좋은 상영관에 대한 요구는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올바르게 꽃피려면 일당 올바른 상영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3대 멀티플렉스가 독점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기준을 세울 경험을 갖기 쉬운가? 많은 관객들은 좋은 상영관에 대한 막연한 열망만 있을 뿐, 그 상영관이 어떤 곳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관객들은 점점 늘어만 간다. 그들은 굳이 극장을 찾는 대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불법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본다. 비판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어 팝콘 가격에 대한 비판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극장 팝콘이 그렇게 비싸다면 그냥 편의점에서 2천원 짜리를 사서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부담스러운 가격의 팝콘을 사는 호구들 덕택에 극장 요금이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당연히 이런 불만들을 하나로 묶고 의미있는 비판과 정보를 더하고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세계에서 이 역할은 전문가들의 몫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영화 전문가들은 극장 문제에 대해선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 그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들을 전문가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칼럼니스트 듀나 djuna01@empas.com
[사진=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CGV]
저작권자 ⓒ '대중문화컨텐츠 전문가그룹' 엔터미디어(www.enter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